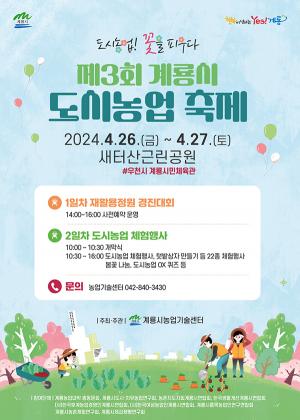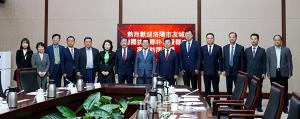- 김학로(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 ▲ 김학로(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한국의 겨울 날씨는 전통적으로 삼한사온의 날씨라고 불리웠다. 마치 정기적이라 할 만큼 삼일 동안 호되게 춥다가도 이후 사일 동안은 포근하기 이를 데 없는 날씨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날씨는 한 겨울 날씨가 아무리 매섭게 춥더라도 견딜 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아침에는 세수를 하고 문고리라도 잡을라치면 손이 문고리에 쩍 붙어버렸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춥던 날씨도 삼일을 넘지 않았고, 이어서 사일은 맑고 높은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 쪼이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반복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겨울 날씨가 이상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의 겨울 날씨는 12월에 날씨가 춥고 눈이 온 뒤로 막상 가장 춥고 눈이 많이 왔던 한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와 눈이 오지 않는 겨울 가뭄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 겨울에 더욱 뚜렷해진 느낌이다. 올 겨울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연일 이어져 한강물이 얼어붙기에 이르렀다. 눈도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왔다. 그러더니 막상 연중 가장 추워야 할 1월 들어서는 마치 봄날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곧이어 봄꽃이라도 필 기세이다. 이를 두고 이상기후라고 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지금 이런 기후 위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 미국 동부 뉴욕주에서는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60명이 넘는 사람이 얼어 죽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 시기 사막지대인 요르단에서는 보기 드물게 폭우가 쏟아져 사막에 폭포가 생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는 소식도 있다. 지난 여름 연일 계속됐던 열대야 현상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집중폭우도 모두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전체 인류의 공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국가적 논의를 넘어 민간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유럽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는 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100%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을 펼쳐서 대체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상품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팔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국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 세계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정부가 추진했던 대체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인 10차 전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6.4%에 불과하다. 40%가 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우만 해도 26.5%이고, 일본도 17.8%인데 비하면 한국의 6.4%란 수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가 분명하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로 높였던 것인데 오히려 2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을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또한 참혹하게 될 것이라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인식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이치고 이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타격은 피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는 일부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국가는 물론 개인으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만약 국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게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기후 위기의 문제는 개인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선민 기자 cmni@hanmail.net